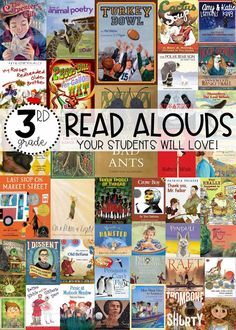
평범함을 넘어서는 법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자신의 역할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는 30퍼센트의 사람들을 지식노동자로 분류헀다. 그들은 지시에 따라 일하지 않고, 전문 분야에서 지성과 창조성을 발휘한다. 중간계층에 이를수록 노동환경은 더 매력적으로 바뀌고, 업무가 더 의미 있어지며,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즉 전문성이 서열보다 더 중시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위한 발달이란, 훨씬 더 많은 직원이 자신이 맡은 작은 업무만이 아니라 전체 업무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기 분야에서 탁월함을 도달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이 과제를 잘 해낸다.
추락했다가 다시 우뚝 일어선 세계적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는 이런 마음가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완벽함 따위는 없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늘 직업에서 탁월함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실현하려 애쓴다. 언제나 완벽한 스윙을 하는 완벽한 골퍼가 될 수 없음을 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끌어내고자 할 뿐이다. 내게는 그것이 직업적 탁월함이다.”
보통의 생각과 달리 탁월함은 완벽함이나 큰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탁월함이란 오늘의 상태를 뛰어넘어 더 성장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탁월함은 상태가 아니라 노력이다.
탁월함은 자신을 뛰어넘어 성장하고 자신의 가능성과 삶의 질을 점점 더 최정상에 가깝게 하려는 의지에서 생긴다. 이런 개념 정의에 따르면, 이미 크게 성공을 했든, 이제 막 열의를 갖고 출발선에 섰든, 탁월함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동시에 기부를 가장 많이 한다. 당연히 이것은 탁월함의 증거이다. 그러나 대학생이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마치고, 정년퇴직을 앞둔 교사가 일주일 안에 저학년 수업을 줌 강의로 바꾸고, 할머니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두가 마스크 제작을 돕는다면, 그것 역시 탁월함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탁월함은 거대한 일로만 실현되는 게 아니다. ‘그저’ 개별 영역에서 혹은 특별한 상황에서 중간 이상으로 성장한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탁월함에 도달할 수 있다. 게다가 철학자 빌헬름 슈미트에 따르면, “탁월함의 규모가 모든 일에서 똑같을 거라 기대해선 안 된다.” 그러므로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훌륭한 연구 성과도 거두면서 집안일까지 창문에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해야 하는 건 아니다. 직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지만 부모로서는 인내심의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친환경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지만 재정 관리 상태는 엉망일 수도 있다.
“한 분야의 탁월함이 모든 분야의 잠재력을 높인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팟캐스트 진행자로, 일론 머스크와 버니 샌더스 같은 명사를 인터뷰하고 수백만 팬이 있는 조 로건이 한 말이다. 왜 그럴까? 직업, 부모 역할, 자원봉사 그 무엇이든 한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은 그 작동 방식을 알기에 무의식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탁월함을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그 어느 때보다 탁월함을 향한 욕구와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육, 자유, 가치, 성장 등을 추구했던 적은 없었다.